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내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자'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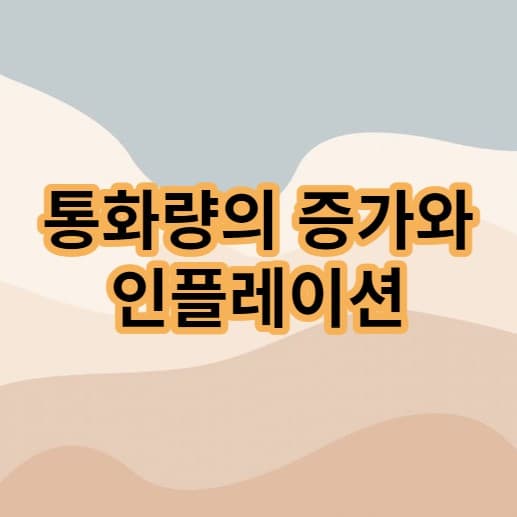
목차
1. 이자와 중앙은행
2. 인플레이션
3. 호황과 불황
1. 이자와 중앙은행
로저 랭그릭(Roger Langrick)의 '새로운 천년을 위한 통화시스템(A Monetary System for the new Millennium)'
이라는 논문에는 이자에 대한 문제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외부 국가와 소통을 일절 하지 않는 단일한 통화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국가의 중앙은행은 딱 1만 원을 발행했고, 시민 1은 그 돈을 빌린 후 1년 뒤에 10,500원으로 갚아야 한다고 합시다. 시민 1은 시민 2에게 배를 구입해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시민 1은 1년 뒤에 1만 500원을 중앙은행에 갚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절대 불가능하다.'입니다. 이유는 이 국가에 존재하는 돈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1만 원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자로 추가적으로 내야 할 돈 500원은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의 금융 시스템에는 애초에 이자라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중앙은행이 또다시 500원을 찍어내고 그 돈을 시민 3이 대출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시민 1이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하여 국가에 있는 돈을 모두 벌어들이게 되면
비로소 중앙은행에 1만 500원을 갚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시민 3은 또다시 중앙은행에게 500원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국가에는 1만 500원 이상의 돈은 존재하기 않기에 중앙은행은 또 돈을 찍어내야 하고
누군가는 또 그것을 빌려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은행 시스템에는 '이자'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이 '이자'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자와 과거의 대출을 갚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대출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통화량을
팽창시키고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결국 중앙은행은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한다는 임무가 있지만, 자본주의의 시스템 때문에
스스로도 화폐를 끊임없이 찍어내면서 통화량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은행도 중앙은행도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지속적으로 돈의 양을 늘리면서 인플레이션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 인플레이션
통화량이 팽창하고 상당기간에 걸쳐 물가가 올라 상대적으로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현상.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은행은 대출을 통해 계속해서 돈의 양을 늘리고 중앙은행은 여러 이유로
돈을 끊임없이 찍어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오히려 시중에 돈이 많이 도니까 돈을 많이 쓰고 벌 수 있어 좋은 현상이 아닐까요?
정부가 지폐의 수를 늘리면 각 지폐의 가치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적어지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오게 됩니다. 은행과 중앙은행이 있는 한, 인플레이션은 절대 피해 갈 수 없는
치명적인 현상입니다.
예시를 통해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을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짐바브웨에서 물가 상승이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한 해에 최고 2억 3100만%라는 엄청난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무가베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이 원인이었습니다. 실업률과 외채의 상환을 위해서 무지성으로
너무도 많은 화폐를 찍어내어 이런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0이 14개나 붙은 100조짜리 짐바브웨 달러가 발행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심각한
하이퍼인플레이션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런 하이퍼인플레이션은 1920년대의 독일에서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과 패전국인 독일 사이에 '베르사유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때 연합국은 독일에게 어마어마한 금액의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아래는 조약의 일부입니다.
"독일은 배상금으로 매년 20억 마르크씩 합계 1320억 마르크를 연합국 측에 배상하고, 독일의 연간
수출액 중 26%를 지불한다. 독일이 약정 기한 안에 이를 지불하지 못하면 연합국 측은 제재 조치로
독일의 대표적 공업지대인 루트 지방을 군사적으로 점령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에 돈을 쏟아붓고도 패전국이 된 독일은 이 정도의 막대한 돈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독일은 중앙은행을 통하여 화폐의 발행되는 양을 크게 늘렸고 국채를 발행해 외국에
헐값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1923년 7월 독일의 물가는 전년도 대비 7500배를 넘어섰으며, 2개월 뒤에는
24만 배, 3개월 후에는 75억 배로 뛰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천 원이던 공깃밥이 7500억 원이 된 것입니다.
독일인들은 4조 2천억 마르크를 모아 환전을 하면 겨우 1달러를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물론 패전국이라는 특수 상황이긴 했지만 국가가 통화량을 무작정 늘릴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호황과 불황
짐바브웨나 독일과 같이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반복됩니다. 러시아의 경제학자 니콜라이 콘드라티예프는 1925년에 자본주의 경제 환경에서
위기가 만들어지는 장기순환주기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기는 48~60년마다 반복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경제학자 슘페터 역시 자본주의의 경제는 물결과 같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콘드라티예프 파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초기에는 신용이 좋은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대출을 주지만, 점점 대출을 받을 사람들이 줄어들면
결국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시중에는 통화량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게 됩니다.
또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산적인 활동에 돈을 쓰기보다는 점점 사치에 돈을 쓰게 됩니다.
비싼 옷, 좋은 집, 차를 바꿉니다. 결국에는 더 이상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